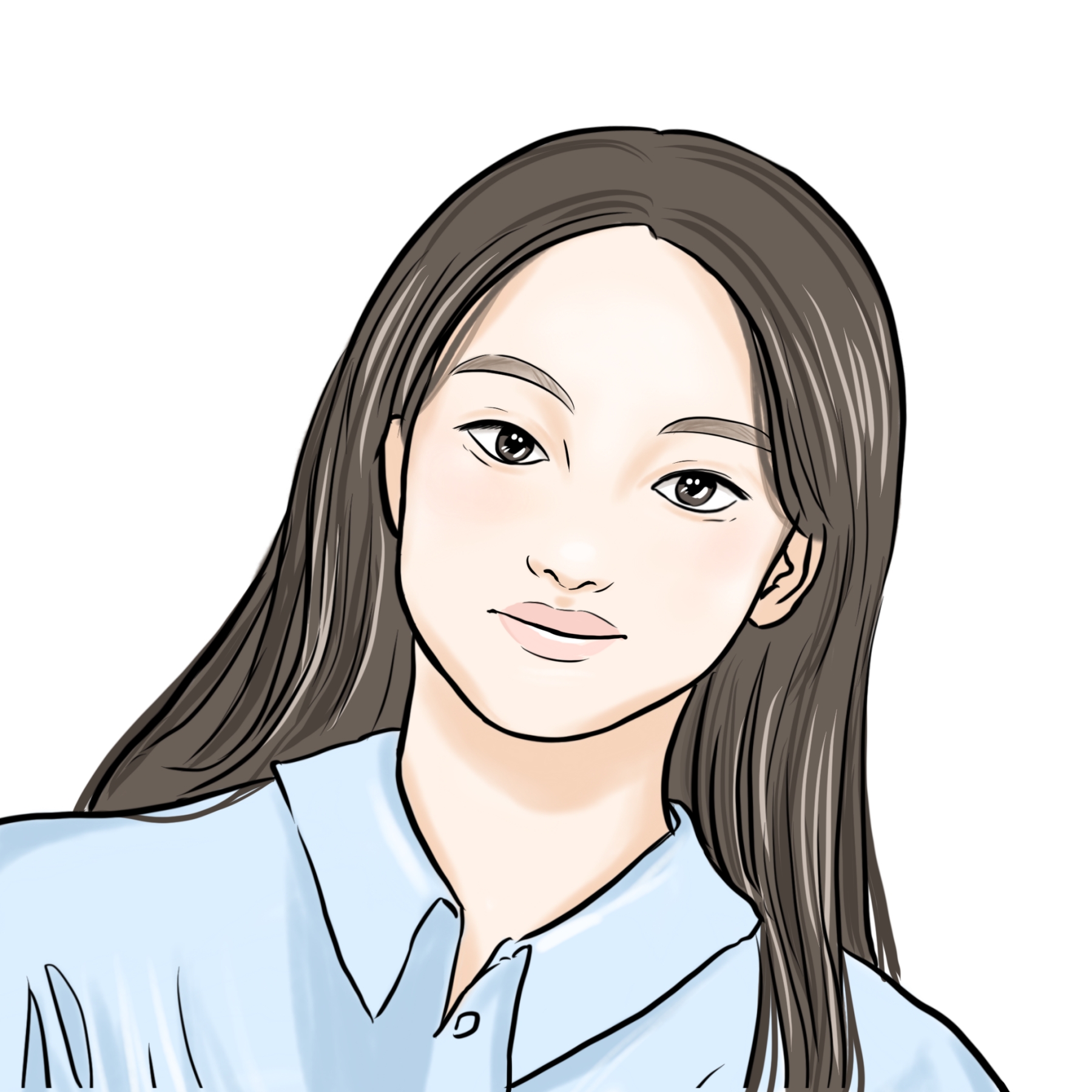
대학의 미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올해 3월, 입학 연령 인구가 입학 정원에 못 미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신입생 미충원 규모가 2022년 8만 명, 2023년 9만 6000명, 2024년 12만 3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직격탄을 맞은 건 지방대다. 남은 학령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 지방대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 지난달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로 대학가가 또 한번 술렁였다. 인하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등 52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해 내년부터 3년간 140억 원가량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는데, 13년째 대학 등록금은 동결된 데다가 국가의 지원마저 끊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변한 사회, 학령인구 감소와 끊겨버린 국가의 재정지원 등을 고려할 때 본교를 포함한 수도권 주요 대학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 위기론은 꽤 오래전부터 제시되어 왔다. 1997년,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 1909~2005)는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 대학은 유적지로 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산술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6년밖에 남지 않았다. 앞으로 대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먼저 기존 대학의 역할에서 탈피해야 한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길성 교수는 『국민일보』의 기사 〈대학의 경쟁 상대는 구글, 네이버〉에서 지식의 생산, 확산, 소비에 있어 대학이 누렸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졌으며, 지식의 반감기마저 짧아져 지식생태가 변했다고 본다. 이 변화 속 강자로 떠오른 것은 기업이다. 네이버와 삼성전자는 인력을 교육하는 아카데미를 세우고 커리큘럼을 마련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는 대학이 다른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도 경쟁해야함을 의미한다. 대학은 기존과 역할이 달라졌음을 깨닫고, 사회 변화에 발맞춰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커리큘럼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2022년부터 빅데이터응용학과,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했다. 국민대학교는 AI디자인학과 등 인공지능 관련 학과 4개를 신설했고, 연세대학교는 아예 인공지능융합대학을 신설했다. 본교 또한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4차 산업혁명캠퍼스’를 만들고 있으며, 융합전공 및 패션&텍스타일디자인 창의융합과정을 도입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대학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사회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기존 학과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론 중점 수업을 줄이고 산업체와 연결된 실습 수업을 늘려, 학생들이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한다.
대학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기 어렵다면 다른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첫 번째는 혁신공유대학이다. 본교는 올해부터 바이오헬스 혁신공유대학에 참여해 새로운 커리큘럼을 도입했다. 이 커리큘럼에는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산학연계 실무 수업도 포함되어있다. 혹은 산업체와 협력하여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채용계약학과를 만들어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하는 방법도 있다. 대표적으로 LG는 KAIST, 고려대학교 등 4개 대학과 채용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오랫동안 대학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이론 위주의 커리큘럼을 보완할 수 있고, 비교적 적은 인력과 자본 투입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아직까지는 특정 대학 또는 신설 학과에만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이와 같은 변화들이 지속되어 퍼져나가야 한다. 대학이 잇따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20년 후에도 남은 대학들이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