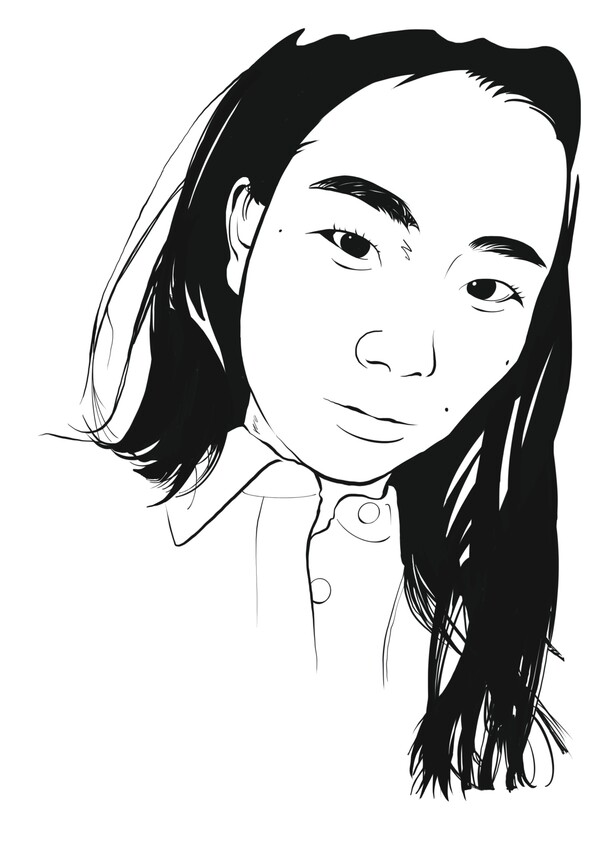
지난 4월 1일(토), 프로야구가 개막했다. 덕분에 기자는 경기가 없는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은 늘 중계방송과 함께하고 있다. 어릴 적 아빠의 어깨너머로 보기 시작해 어느덧 삶의 일부가 된 야구를 보며 느낀 건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야구는 1회 동안 낼 수 있는 점수가 무한하고, 경기 시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고 그들을 막을 수도 없다. 짧게는 3시간 길게는 4시간, 5시간까지도 이어지는 경기에 선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곧 자신의 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입사한 지 어느덧 1년이 조금 넘은 기자가 되돌아본 신문사는 야구와 많이 닮아있었고, 매주 바라본 동기들은 프로가 돼가고 있었다. 한 경기에 최대 12회의 기회가 주어지는 야구처럼 본지에도 12면이라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모든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듯, 12면이라는 제한된 면적에 모든 기자는 자신이 쓰고 싶은 기사를 쓸 수 없다.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기자들은 오직 자신이 쓴 글로 독자들에게 기억되고 평가되곤 한다. 야구에서 타자는 타율로, 투수는 평균자책점이라는 수치로 평가되듯이, 본지는 홈페이지 조회수와 배부대에 남아있는 신문으로 한 주의 성적을 확인하곤 한다.
기자는 작년 이맘때쯤 첫 마감을 하며 기계처럼 일하는 선배들에 꽤 큰 충격을 받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그 충격에도 기자의 발걸음은 1년째 매주 강당(S동) 211호로 향했고, 노트북의 키보드는 반질반질해졌으며 ‘신문사’ 폴더에는 점차 글이 쌓여갔다. 그렇게 신문사는 야구 못지않게 기자의 일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올해부터는 매주 발간 체제로 바뀌며, 한 호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한 호를 시작해야 했다. 본지는 일주일 동안 작성한 기사를 금요일에 업로드하고 서로의 피드백을 통해 다듬고 완성해나간다. 늦은 밤까지 수정 그리고 또 수정을 거친 기사를 ‘완료’한 후에야 퇴근할 수 있다. 늦은 밤 퇴근이 무색하게 토요일 1시에 다시 모든 기자가 S동에 모인다. 이날은 디자인 마감을 하며 다음 호를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기자들은 자신의 기획서를 설명하며 지면에 해당 기사가 들어가야 할 이유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눈다. 그렇게 완성된 다음 호 기획서로 배분 회의를 진행하며 또 하나의 12면을 시작한다.
1319호부터 1323호까지 5번의 매주 발간을 경험한 결과, 매주 12면을 채워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작년 겨울 매주 발간 체제로의 전환이 확정됐을 때, 기자들의 업무 강도를 걱정하던 행정실 측은 8면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었다. 학업과 신문사를 병행해야만 하는 기자들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하지만 기자들은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지며 12면 매주 발간을 선택했다. 12면을 직접 손을 들어 선택한 입장으로서 이유를 설명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팬데믹 이전, 신문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때부터 선배들이 해오던 발간 체제를 끊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지에는 버릴 고정란이 없다. 8면으로 개편할 경우, 최소 3~4개의 고정란 삭제가 불가피했고, 이는 훨씬 수월한 업무가 가능함을 의미했지만, 기자들은 신문의 질을 먼저 생각했다. 그렇게 12면 매주 발간이 결정됐고 “괜찮겠냐”는 선배들과 행정실 측의 우려가 있었지만 웬만해선 57기를 막을 수 없었다.
기자를 비롯한 많은 야구팬은 습관처럼 “이제 안 볼 거다.”라는 말을 한다. 물론 대부분은 이 말을 지키지 못하고 다음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진심을 다해 응원한다. 이는 야구팬의 숙명이다. 그리고 기자에게는 신문사도 그러하다. 일주일 동안 온 신경을 쏟아야 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무조건 신문사에 반납해야 하지만 늘 그랬듯이 S동 211호로 향한다. 무언가에 오롯이 열중한 하루하루를 얻을 수 있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정신없는 하루도 애틋하게 기억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치열했던 6번의 매주 발간을 마치고 잠시 쉬어간다. 이번 1324호 발간 이후 3주간 휴간할 예정이다. 기자는 6주 동안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은 기자 스스로와 동기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며, 그리고 11면의 끝자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