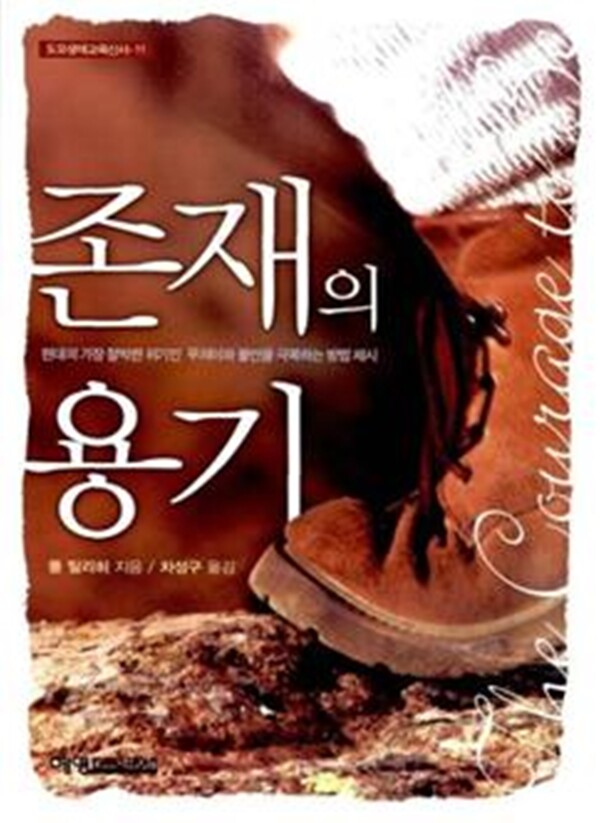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가?” 인간은 이러한 존재론적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살아간다. 일상에 쫓기다가도 문득 다가오는 이 질문들은 세계와 타자 속에서 나 홀로 있음을 사유하게 한다. 태어나자마자 낯선 세계와의 마주함으로 시작하는 인간의 일생은 죽음의 순간까지 많은 타자들과의 조우와 이별을 반복한다. 그러한 여정 가운데 동반되는 것이 바로 외로움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외로움은 내가 세계와 타자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감정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외로움을 의미하는 영어 ‘Loneless’는 고독의 뜻을 지닌 ‘Solitude’와 연관되면서도 다른 층위에 있는 용어이다. 전자가 타자로부터의 고립에서 비롯된 관계적 개념이라면, 후자는 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의미하는 독립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인은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 익명의 타자들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한다. 이러한 현상 또한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떨쳐버리려는 욕망의 발현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타자와의 연결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함은 지극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간만이 소유한 영혼이라는 층위에서 보면, 영혼이 고요할 때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 영혼의 고요함, 이것은 내가 고독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고요한 영혼에 잠겨 있을 때,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실 고독할 때 영혼은 잠잠해지며, 타자로부터 분리된 나를 외로운 존재가 아닌 인간 그 자체로서 성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외로움이나 고독을 극복하기 위한 철학적·신학적 성찰을 제공하는 『존재의 용기(The Courage to Be)』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폴 틸리히(Paul Tillich, 1886~1965)의 저서로, 혹자는 제목을 ‘존재의 용기’가 아닌 ‘존재에의 용기’로 번역해야 옳다고 말한다. ‘Courage to be’는 단순히 존재의 용기가 아니라, 존재하기 위하여 그것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의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홀로 있음의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홀로 있음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 고독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는 틸리히의 주장은, 두 용어에 내재된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책 전반에 신학적인 서술이 많기는 하나, 저자는 고독이라는 비존재를 존재 안으로 끌어안을 때 존재에의 용기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는 비단 고독뿐 아니라 염려, 불안, 두려움 등의 비존재들을 나의 존재 안으로 수용할 때 비로소 인간으로 존재하게 되는, 즉 존재에의 용기로 나아갈 수 있음을 뜻한다. 그가 전하는 ‘존재를 밝혀주는 비존재’에 관한 아래의 말들은, 비존재가 존재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임을 말해준다.
“비존재는 존재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존재에서 분리될 수 없다.”(『존재의 용기』, 215쪽)
“비존재 없는 존재의 자기 긍정은 자기 긍정이 아니라, 전혀 움직이지 않는 자기 동일성일 따름이다.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으며, 아무것도 표현되지 않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다.”(『존재의 용기』, 215쪽)
“그러나 비존재가 있는 곳에는 유한성과 불안이 있다. 비존재가 존재 자체에 속한다는 말은, 유한성과 불안이 존재 자체에 속한다는 말과 같다. (중략) 무한은 자신과 유한을 포함하고, 긍정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속으로 이끌어 온 부정을 포함하며, 행복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정복한 불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모든 것은 존재가 비존재를 포함하고 비존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말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존재의 용기』, 216쪽)
위의 틸리히의 표현처럼, 우리는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용기에 비존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위안을 얻는다. 어쩌면 존재 내에 그러한 비존재들이 있기에, 내가 속한 세계에서 타자들과 함께 존재함에 감사를 느끼는지도 모른다. 인간 삶의 역동성은, 바로 이러한 비존재를 직면하고 그것을 끌어안는 용기, 즉 존재로 나아가려는 역동적 의지인 ‘존재에의 용기’에 있지 않겠는가.
학부 4학년 재학시절, 그러한 비존재와 거칠게 씨름하던 순간에 마주한 영화가 있다. 바로 차이밍량(Tsai Ming-liang, 1957~) 감독의 <애정만세(Vive L’amour)>(1995)이다. 이 영화는 각각 부동산 중개업자, 불법노점상, 그리고 납골당을 판매하는 직업을 가진 세 청년 메이, 아정, 시아오강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차이밍량의 초기작품에 나타나는 영화적 언어는 본질로부터 표층으로 파편화되는 일상에 관한 존재론적 스토리텔링이다. 이 영화에도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 고독, 불안, 욕망 등과 같은 인간 존재에 관한 본질적 요소들이 일상 가운데 표층화되어 있다. 대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의 모습으로부터 틸리히가 말한 바로 그 ‘비존재들의 존재함’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존재에의 용기’를 목격할 수 있었다. 영화의 제목인 <애정만세>는 애정이 부재하는 물질중심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고독한 외침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지만, 진정한 의미는 세계 속 타자들과의 사랑을 향한 갈망일 것이다.
『존재의 용기』와 <애정만세>를 통해, 비존재에 관한 텍스트와 청년들의 삶을 함께 만나보길 권한다. 두 작품은 비존재 가운데 내던져진, 그러나 그것을 끌어안는 존재에의 용기로 나아가려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전한다. 비록 영화 속 청년들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재현되지 않았을지라도, 비존재를 직면하며 허우적대는 그들을 향한 나의 위로가 다름 아닌 나 자신을 향한 위로가 될 것이다.
오늘도 비존재를 포용하며 존재로 나아가고 있는 홍익대 학생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The Courage to Be’를 향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