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이 움직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는 움직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촌역 부근 한적한 골목길, 가만히 그리고 고요히 꿈틀대는 움직임들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에는 신촌 문화발전소가 있었다. 비스듬한 언덕길에 선 건물은 정겨운 골목길의 내음과 녹색 풀들과 함께 싱그러운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1층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바깥과는 사뭇 다른 공기가 서려 있었다. 새소리가 들리고 식물과 사람이 있는 그곳, 하지만 스피커와 캔버스 안에서 움직이는 그것들. 익숙한 것들이 낯선 곳에서 다가오는 그 전시관에 기자는 살짝, 발을 들여보았다.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움직임>展은 추상적인 표제처럼 어렴풋한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전시 참여 작가들은 각자의 고유한 기호를 소리와 회화, 활자를 매개로 전달한다. 눈을 감아도 울리는 파동, 보이는 것 너머의 세상을 녹인 색채와 형상, 그리고 온 세상을 담은 작고 검은 개념이 한 공간에 모여 부딪히고, 전이하고, 공명하고, 연대한다. 각자의 삶이 움직이는 방식을, 그리고 각자의 삶이 움직이게 하는 것들을 물으며 탄생한 작품들은 우리에게도 넌지시 질문을 던진다.

전시관 1층에서는 김대유 작가의 회화 작품들을 볼 수 있다. 그의 작품은 익숙한 것들을 담고 있다. 밤의 어둠과 나뭇가지, 어린아이같이 언젠가 그리고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무는 것들이다. 나란한 이미지들은 우리가 만들어 낸 연결고리를 통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다른 작품으로 눈을 옮길 때마다 우리를 아주 먼 세상으로 데려가기도 한다. 작품들은 우리의 시선보다 비교적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것은 작품 속 그것들이 이 두 땅에 굳건히 발을 딛고 살아있다는 인상을 주어, 캔버스가 비추는 것들이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무언가로 보이게끔 한다.
가만히 울리는 안민옥 작가의 소리는 김대유 작가의 이미지와 결합해 새로운 맥락을 창조한다. 우리가 떠올린 것에 힘을 싣기도 하고, 그것을 전복시키기도 한다. 전시관에 울리는 작은 새의 지저귐과 자연적인 소리는 익숙한 이미지들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벽에 가만히 기대어 있는 생명력을, 소리가 파동을 통해 우리 귀에 직접 전달한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면 현실은 기이하게 일그러진다. 생명력 넘치는 새의 울음소리는 부리가 아닌 스피커에서 울려 퍼진다. 자연의 울음소리는 스피커가 내는 파동이며, 어린아이와 식물의 생명력은 캔버스 표면에 굳은 꾸덕꾸덕한 색채와 형상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오묘한 기운을 흠뻑 맞고 계단을 오른다. 꿈에서 현실을 찾아 헤맨 듯한 희뿌연 1층의 감각과 겨루듯 4층은 현실에서 찾아낸 선명한 감각을 쏟아낸다. 아득한 하늘과 빽빽한 건물들을 배경으로 한 안태운 시인의 <사랑을 굴러가게 한다고 그런 사랑이>와 통유리 너머 짙은 녹색 나무들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한 <그것에 누가 냄새를 지었나>는 눈부시도록 선명한 감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사유를 불러온다. 아주 익숙한 ̒숲’, ̒나무’, ̒땅’, ̒창문’ 같은 단어들을 말하면서도 ̒사랑’과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다. 친숙한 감각들 속에서 영원히 알 수 없는 것들을 외친다.


발걸음을 돌려 1층으로 다시 돌아와 문 앞에 섰을 때, 시작점에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안태운 작가의 시 <감은 눈이 내 얼굴을>을 볼 수 있었다. 전시관에 들어서는 순간 무심코 지나친 고요한 시 한 편을 겨우 발견한 것이다. <감은 눈이 내 얼굴을>은 역시 익숙한 감각 속에서 낯선 것을 외친다. 4층에서 느낀 붕 뜬 감각이 전시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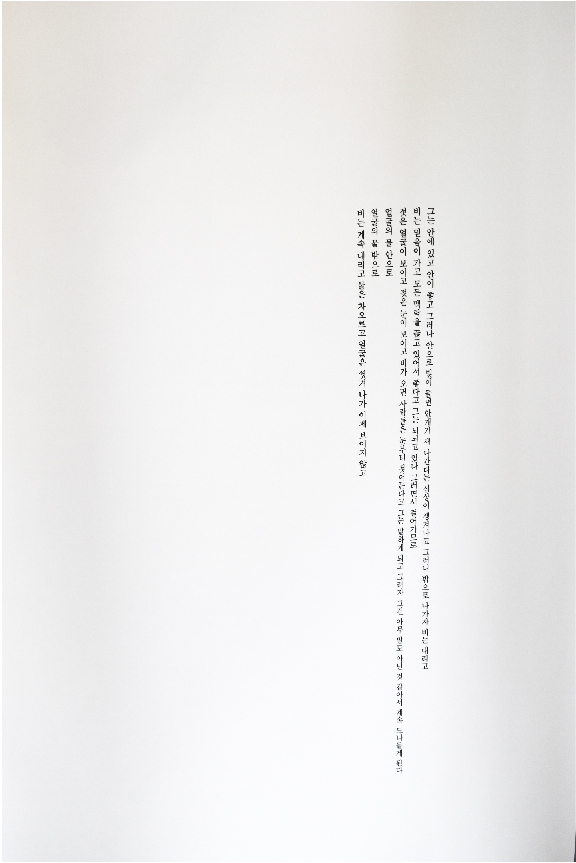
“삶이 움직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는 움직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시를 감상하며 기자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삶이 무엇인지, 움직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질 뿐이었다. ̒나’는 어떤 움직임을 하는 삶을 사는지, 작가들은 어떤 움직임을 통해 어떤 삶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었는지 그저 질문하게 될 뿐이다.
전시 감상을 마치고 다시 곱씹어 본 전시 제목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움직임>展에서는 아주 비릿하고도 달콤쌉싸름한 맛이 났다. 물질과 비물질이 뒤섞이며 현실과 비현실, 그리고 기억과 경험을 불러일으킨 전시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은 채 가능성을 품고 제 자리에 있다. 아주 천천히 부식하는 물감, 일렁이는 음파, 그리고 무한한 의미를 담고 꿈틀대는 단어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저 그렇게 존재할 뿐이다. 확실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단서보다 그 무엇에도 이름을 붙이지 않고 여지를 남기며 움직인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올 우리의 사유와 추측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시 기간: 2023.03.25(토)~06.17(토), 일/월 휴관
관람 시간: 10:00~21:00
전시 장소: 신촌문화발전소 1층, 4층
관람 요금: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