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터스포츠, 또는 F1(Formula 1 World Championship)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기사의 부제는 중계 중 스타트 상황에서 늘 나오는 멘트로, 1등을 위해 달려가는 F1의 상징과도 같다. 속도라는 본능을 좇는 드라이버들과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쏟아붓는 팀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열광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속도가 주는 쾌감에 매료되어 있을 것이다. 이 쾌감의 대열을 우리도 즐길 수 있도록 앞장서는 윤재수 모터스포츠 해설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현재 쿠팡플레이(Coupang Play)의 F1 생중계 해설위원을 맡고 있다. 현재 해설을 진행 중인 F1의 역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A. 사실 F1의 역사를 소개하려면 자동차의 역사를 소개해야 하고, 자동차의 역사를 설명하려면 산업혁명 이후 근대 기술 발전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우선 자동차의 시작은 증기기관 자동차다. 증기기관 자동차는 프랑스에서 발명되었지만, 이는 실패하고 관련 기술은 영국으로 넘어갔다. 이후 1876년 고틀리에프 다임러(Gottlieb Daimler, 1834~1900), 오토(Nicolaus Otto, 1832~1891), 그리고 마이바흐(Wilhelm Maybach, 1846~1929)가 가솔린 4행정 내연기관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이용해 처음으로 특허를 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최초의 자동차를 발명했다고 알고 있는 카를 벤츠다(Carl Benz, 1844~1944). 벤츠의 아내였던 베르타 벤츠(Bertha Benz, 1849~1944)는 이 자동차의 홍보를 위해 자신의 두 아이를 태우고 만하임에서 친정인 포르츠하임까지 왕복 약 200km의 거리를 스스로 운전했다. 사실상 최초의 테스트 드라이버이자, 미캐닉이자, 테크니션이었던 셈이다. 벤츠 외에도 독일의 다른 도시, 프랑스, 심지어 대서양을 넘어 미국에서까지도 자동차 브랜드가 등장했다. 이 자동차 회사 소유주들은 자신의 차가 최고임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레이싱을 택했다.
최초의 자동차 레이스는 1894년 프랑스의 한 신문사가 주최한 대회다. 이 대회가 흥행하자 유럽의 도시 간 레이스가 여러 곳에서 개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다. 드라이버의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한 것이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법을 제정해 도시 간 레이스를 금지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도시 외곽을 도는 ‘서클 레이스’로 방식을 바꿨다. 바뀐 방식으로 처음 진행된 레이스는 ‘1906 프랑스 그랑프리’로 명칭이 정해졌고, 이 명칭과 기본 방식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그랑프리가 크게 성공하자 유럽 전역에서 그랑프리가 열렸고, 자동차 회사들은 자신이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경쟁을 시작했다. 여기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나라가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다. 그런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편파 판정이 난무했고, 결국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자동차연맹(AIACR)’이 탄생해 그랑프리와 ‘유러피안 챔피언십’을 주관하게 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AIACR은 국제자동차연맹(FIA)으로 확장되고, 1947년부터 F1 그랑프리가 출범했다. 이는 1950년에 F1 챔피언십으로 변경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F1이 탄생했다. 모터스포츠는 여러 갈래로 분화됐지만, 각자가 자동차를 만들어 최고의 자동차를 겨루자는 레이싱의 원류를 그대로 계승한 것은 F1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도 최고의 인기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다.
Q. F1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
A. 어린 시절 형이 소위 자동차 광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자동차공학 책을 끼고 다닐 정도였다. 그런 형 옆에서 억지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어렸던 당시에는 일본 서적과 영화의 국내 반입이 금지됐었는데, 대만 대사관 앞에서는 그걸 몰래 팔던 상인들이 있었다. 형은 거기서 매년 ‘세계 자동차 도감’ 같은 제목의 책을 사 왔다.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F1인 만큼 형을 통해 자연스럽게 F1을 접했다. 그 외에도 그 당시 어린이를 위해 발간되던 신문에는 ‘세계 자동차 선수권 대회’ 라는 이름으로 F1이 몇 번 소개되어 있었고, 화교들이 많이 가던 식당에는 녹화본을 방송해 주기도 했었다. 그렇게 접해왔던 F1을 성인이 되고 나서도 종종 챙겨보곤 했다. 2005년, 일본 그랑프리에서 키미 래이쾨넨(Kimi Räikkönen)이 맨 마지막에서 출발해 1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래이쾨넨의 팬이 됨과 동시에, F1을 매 경기 챙겨보게 됐다.

Q. 게임업계에서 일하다 2010년 F1 한국 그랑프리에서 스포츠채널 관계자의 제의로 해설가가 됐다. 한 명의 마니아에서 국내 최고의 F1 전문가로 인정받게 된 과정이 궁금하다.
A. F1의 팬이 된 이후 F1에 대한 블로그를 시작했다. 그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병행했었는데, 회사 업무가 내가 추구하던 방향과 달라서 직장은 그만두고 블로그 운영에 집중했다. 그때 내 꿈은 F1을 설명해 주는 책을 내는 거였다. 모터스포츠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블로그 규모가 점점 더 커졌다. 2010년 코리아 그랑프리 D-50 행사에 파워블로거로 초청받아 전라남도 영암 서킷에 간 적이 있다. 그날 행사에서 중계 담당 캐스터를 만나 ‘10년쯤 후에는 할아버지가 이야기 해주듯이 나도 해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었다. 이틀 후 해설을 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해설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코리아 그랑프리 첫 해, 레이스가 지연될 때 내가 쉬지 않고 계속 말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아마 그때부터 전문가로 인정받지 않았을까 싶다.
Q. F1 그랑프리 해설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A. 기본적인 자료는 평소에 계속 정리하고 있다. 이전 경기들의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온다. F1 관련 뉴스는 공식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 SNS에 올라오는 내용을 평소에 수집한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출처에서 나온 가짜 뉴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뉴스보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는 것과 전문가 분석을 위주로 찾아보는 편이다. 이렇게 평소에 해놓아야 중계방송에서 해설을 진행할 수 있다. 생중계 중에는 찾아놓은 자료를 볼 시간조차 없기 때문이다.
Q. 모터스포츠 해설가는 각 드라이버와 팀의 특성뿐만 아니라 공학적 지식, 영어 능력까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들을 어떻게 쌓았는가?
A. 공학적 지식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관련 책을 보긴 하지만 실려있는 내용은 단편적이다. 제일 좋은 건 그런 지식을 직접 체화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니 게임에 많이 의존했다. 특히 ‘그란투리스모’라는 게임에 같이 첨부된 책을 많이 참고했다. 그 배경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은 어린 시절 형 옆에서 억지로 들었던 것들이다. F1 관련 지식은 경기를 많이 보면 자연히 는다. 영어는 정말 자신 없지만,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팀 라디오의 경우는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들린다. 사실 팀 라디오는 드라이버, 페독(Paddok), 심지어 현지 중계진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걸 생각하면 아이러니하다.
Q. 가장 좋아하는 F1 드라이버로 키미 래이쾨넨을 꼽았다. 이유가 무엇인가?
A. 아무래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일본 그랑프리가 가장 큰 계기였다. 그 경기를 본 이후 래이쾨넨에 대해 더 찾아봤더니 그가 살아온 인생과 성격까지도 내 취향이었다. 카트를 위해 온 가족이 집을 팔고 캠핑카에서 살 정도로 가난했고, 4살 때까지 말을 거의 못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동물적 감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래이쾨넨 이전에 활약했던 제임스 헌트(James Hunt, 1936~1968), 닉 하이트펠트(Nick Heidfeld, 1977), 짐 클락크(Jim Clark, 1947~1933) 등도 좋아한다. 그리고 아직 F1에 데뷔하지 않은 신인이지만 테오 폴쉐어(Theo pourchaire)를 기대하고 있다.
Q. 우리나라는 F1을 비롯한 모터스포츠의 불모지로 불린다. 모터스포츠의 국내 대중화를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A.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시청자들에게 듣기 좋고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계 드라이버가 출전하는 것도 인기를 끌어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다. 하지만 모터스포츠가 유명해졌다고 해서, 그게 다른 스포츠의 자리를 빼앗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모터스포츠가 자리 잡는 과정이 아니라 일시적인 유행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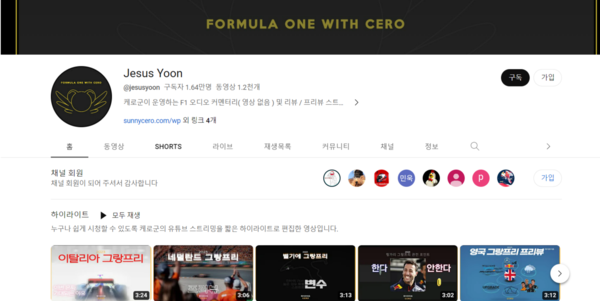
Q. 모터스포츠만의 매력을 느낄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A. ‘스포츠’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 스포츠의 경계에서는 벗어나 있다. 스포츠와 자본주의, 과학기술이 서로 융합된 형태다. 특히 F1은 우주개발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한 회사가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를 위해 돈을 투자하고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스포츠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척자로서 기술을 시험하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것을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진입장벽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걸 조금만 넘으면 벗어날 수 없는 쾌감이 있다. 내 역할은 이 쾌감을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것이다. 마치 커피를 추천하는 바리스타와 같은 일을 하는 셈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쾌감을 즐길 수 있도록 해설과 개인 방송 활동을 하고, 책도 출판하고 있으니 하나씩 맛보고 같이 재미를 느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