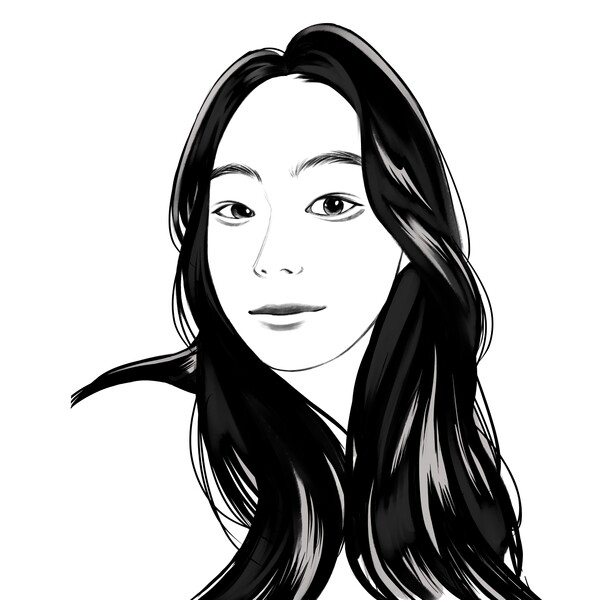
‘학생 자치의 위기’. 이젠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다. 해마다 진행하는 총선거에 막상 후보가 없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단선으로 출마한 후보는 이젠 익숙하다. 어쩌다 여러 선거운동본부가 출마해 경선을 치러야 하면 오히려 당황스럽다. 지난 22일(수) 오전 8시부터 23일(목) 오후 7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2024 단결 홍익 총선거에는 총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 후보가 없다. 몇몇 단과대학도 마찬가지다. 재선거 이후에도 이대로라면 내년 1학기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총 15단위 중 7단위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투표율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번 총선거는 원래 23일(목) 오후 7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투표율 미달로 인해 24일(금) 오후 7시로 연장됐다. 총학생회 측에서 공개한 투표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당선된 후보들도 몇 퍼센트 차이, 심지어는 소수점 아래 자리의 차이를 기록하며 가까스로 개표 가능 투표율을 넘겼다.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분명 ‘자치(自治)’인데, 막상 스스로 하는 사람이 부재한 지금 상황이 위기가 아니면 무엇일까.
‘대학 언론의 위기’. 이것도 너무 익숙한 말이 되어버렸다. 이제 이 말은 진부하기 짝이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다. 신문을 매주 내도 배부대에는 신문이 줄지 않는다. 어느 날 신문이 많이 줄었다 싶은 때에는, 학우가 작업하는 데 재료 또는 깔개로 사용하려 가져간 것이거나 미화 노동자분이 청소를 위해 가져간 경우가 허다하다. 학보와 신문이란 존재를 아는 학내 구성원이 과연 몇이나 될까? 아예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니 신문사의 인력난은 끝없이 반복되고, 권위가 없으니 인터뷰는 거절당하는 일이 더 많다. 학보사 국장들끼리 모인 날엔 돗자리와 라면 받침이라며 자조하는 웃음소리가 한 번씩 빈 잔을 채운다.
이 위기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입학과 동시에 신문사를 선택했다. 그 당시 기자의 삶이 더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로또’라는 논술 전형의 별명처럼, 기자는 약 천 삼백자의 글 두 편과 최저기준을 충족한 수능 성적만으로 하루아침에 경영학도가 됐다. 그렇게 시작된 새내기 생활은 매번 기자의 생각과는 반대로 흘러갔다. 대학에 가면 수학은 절대 안 할 거라고 다짐했던 것과 반대로 복잡한 수식과 씨름해야 했고, 어느새 공학용 계산기를 두드리며 효율을 찾는 사람이 됐다. 이런 삶을 위기로 여겼던 기자는 탈출구가 필요했다. 이 학교에, 이 사회에 스스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게 해줄 무언가를 찾다 결국 기자실 문을 두드렸다. 그 선택으로 초기 목적은 달성했다. 인력난에 시달리던 신문사에서 기자는 드디어 필요한 사람이 됐다. 강당(S동) 211호는 기자의 안식처였다. 여기저기 취재를 다니고, 기사를 쓰고, 선배 그리고 동기들과 마감을 하는 일은 즐거웠다. 이 일이 재밌다고 생각하며 기자라는 직업을 꿈꾸게 됐고, 어느새 부편집국장을 거쳐 편집국장이 됐다. 그리고 이젠 떠날 시간이다.
이름 뒤에 기자라는 호칭을 붙였던 지난 2년 동안, 기자가 되게 해준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여러 차례 찾아왔었다. 그런 위기에 부닥쳐 새벽녘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고, 동기들 앞에서 꼴사납게 울어보기도 했다. ‘내가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매번 일주일을 버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들도 신문에 있었다. 취재와 인터뷰를 하며 만난 모든 인연은 아직도 기자의 메일함, 통화기록, 문자와 채팅 메시지에 남아있다. 아마 기자는 이들과 나눈 이야기를 잊지 못할 거다. 매번 취재와 마감을 도와주셨던 주간 교수님과 행정실 관계자분들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가르쳐주신 어른들이었다. 일이 힘들다고 푸념할 때, 밤늦게 전화로 “너도 아직 어리잖아. 괜찮아.”라며 기자를 다독여준 친구들도 신문에 녹아들어 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정말 잘 하고 있고, 그걸 좀 더 자랑으로 여겨도 된다고 말해준 타 학보사 국장들은 기자가 편집국장이었던 1년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우리가 없어도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58기 후배 기자들, 깔끔한 지면과 멋진 그림을 만들어 준 디자인부 기자들, 그리고 기자의 옆에서 2년간 곁을 지켜준 57기 동기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위기는 늘 닥쳐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목적지까지 왔다.
